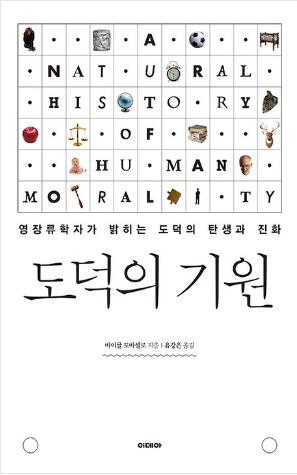
600만 년 전쯤 아프리카 어딘가에 살았던 대형 유인원과 인류 최후의 공통 조상은 사회적 생활을 영위했다. 그 생활의 기본 원리는 서열과 경쟁이었다. 이 유인원들은 사회적 삶을 통해 도구적 합리성을 습득했고, 그리하여 일종의 ‘마키아벨리적 지능’을 갖고서 유연한 전략을 실행하고 심지어 동종 개체의 정신 상태를 예측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친족과 협동 파트너에 대해 공감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 인간 도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감의 도덕’이 탄생한 순간이다. 시간이 흘러 40만 년 전 생태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협동적 먹이 찾기가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초기 인류는 원숭이, 대형 유인원과의 먹이 경쟁에 시달리는 가운데 나무 열매나 과일, 소형 포유류 대신 큰 사냥감을 노려야 했다. 이제 협동과 협업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면서 인간은 불가피하게 상대방을 인지하게 되었고, 복수의 행위자인 ‘우리’를 형성해서 함께 행동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먹이를 찾고 양자 모두가 자격이 있는 파트너로서 사냥 전리품을 동등하게 공유했다. 신뢰와 존중, 책임, 의무, 자격 등의 감각을 공유하면서 인간 특유의 ‘공정성의 도덕’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 초기 인류는 다른 어떤 동물 종과도 다른, 진정한 인간이 된 것이다. 다른 어떤 유인원도 인간만큼 상호 의존하는 사회적 삶을 영위하지 않았다. 토마셀로가 보기에 당대 인류인 우리는 이런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 단계에서 획득한 도덕 심리가 켜켜이 쌓여 있는 존재다. 원시적인 ‘공감의 도덕’과 더 복잡한 ‘공정성의 도덕’, 그리고 ‘정의의 도덕’까지 우리 내면에 똬리를 튼 채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조정되며,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떤 도덕적 행동이나 비도덕적 행동을 한다.
이런 진화 과정은 개체 발생에서도 비슷하게 되풀이된다. 세 가지 도덕은 각각의 진화 단계에서 등장한 것이지만, 나중 단계의 도덕이 무조건 더 중요하거나 상위의 도덕인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간 종이 어떻게 대형 유인원과는 달리 인간만의 진정한 도덕을 추동시켰는지를, 특히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이 책이 현대 사회가 제시하는 갖가지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인간은 직립한 원숭이일 뿐 아니라 다른 어떤 동물 종과도 달리 새로운 종류의 협력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부터 도덕이 탄생한 과정을 더듬는 것만으로도 도덕적 인간으로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유강은 옮김. 이데아. 값 19,000원
